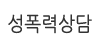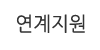성폭력과 함께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살인·강도·방화 같은 폭력의 발생 원인으로 범인의 정신건강 문제, 실업·빈곤 같은 불평등 문…
성폭력과 함께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살인·강도·방화 같은 폭력의 발생 원인으로 범인의 정신건강 문제, 실업·빈곤 같은 불평등 문제, 고립, 가정불화, 모방범죄 심리 등이 주로 꼽힌다. 여기서 우리가 빠뜨리는 이유가 있다. 범인의 대다수가 남성이라는 점이다. 살인·강도·방화 범죄의 약 82%(이하 2023년 기준 경찰청 통계)는 남성이 저지른다.(성폭력 범죄에서 남성이 범인인 비율은 약 96%에 이른다.) 폭력은 이처럼 젠더 불균형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영역 중 하나다.
젠더폭력은 불평등한 젠더 관계로 인해 또는 그 관계를 만들어내는 모든 폭력을 통칭하는 말로, 주된 피해자는 여성이지만 남성과 성소수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행사한 폭력에서만 젠더(성에 따라 의미를 다르게 부여하는 사회문화 구조)를 떠올리고, 그 밖의 상황에서는 젠더의 작동 방식조차 고려하지 않는다. 최윤종이 2023년 8월 서울 관악산 등산로에서 지나가던 여성에게 강간을 시도하고 살해한 사건과 달리, 조선이 2023년 7월 서울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남성 한 명을 살해하고 세 명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과 최원종이 2023년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한 쇼핑몰에 차를 몰고 돌진한 뒤 쇼핑몰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사건에서는 젠더에 관한 논의가 촉발되지 않았다.
하지만 범죄 수행이 젠더 수행, 즉 젠더를 생산하는 반복된 실천 중 하나라는 관점에서 보면 세 사건 모두 젠더가 작동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책 ‘폭주하는 남성성’에서 이들 세 사건 이야기를 시작으로 젠더와 폭력의 관계를 밝힌 추지현 서울대 교수(사회학)를 2025년 7월28일 인터뷰했다. 남성성이란 남성다움의 의미를 획득하는 구체적 실천을 일컫는 말이다.
―책에서 남성성의 실천이 폭력의 맥락을 구성하는 현실에 주목한 이유는.
“‘묻지마 범죄’ ‘흉기 난동 범죄’로 일컫는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들이 왜 그런 폭력을 행사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취약성에 집중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젠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가해자가 이성애 관계에서의 연애·결혼·취업 등 기존 남성다움에 대한 정상성 트랙에서 ‘실패한 남성’으로 인식하는 자신의 주변적 지위(주변화된 남성성)에 대한 분노를 그 원인인 사회의 부정의에 맞서는 에너지가 아니라, 왜 여성·성소수자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자원으로 활용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는 식이다. 즉, 가해자의 남성성 실천이 어떻게 등장했는지를 알아야 폭력으로 귀결되는 남성성의 등장을 막을 수 있다.(추지현 교수는 책에서 남성들의 폭력 사이에 무엇이 놓여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서로의 맥락을 형성하는지를 설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주목했다.
“앞의 세 사건 사이에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폭력의 맥락을 만들어내는 또 다른 남성들의 실천 역시 존재했다. 조선과 최원종은 디시인사이드의 여러 갤러리를 통해 남성으로서의 열패감을 드러내고 인정받았다. 최윤종은 ‘동거녀 살인’이나 무장 탈영 군인의 총기 난사 사건 등 또 다른 남성들이 폭력을 실천한 사례를 검색하며 범행을 감행했다. 그리고 이들의 범죄 이후 그곳에서 다수의 ‘살인 예고 글’이 등장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 예고나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 행사를 독려해온 온라인 커뮤니티는 더 이상 단순한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라 남성으로서의 폭력 행사를 부추기고 정당화하는 체계적인 공간, 즉 젠더불평등을 구조적으로 재생산하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폭력의 젠더화된 맥락을 살피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 가해자의 폭력성에 여성혐오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했고 그 폭력을 가능하게 한 조건은 무엇인지, 즉 문제 해결을 위해 개입할 지점이 어디인지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예컨대 주변화된 남성성으로서 (2012년 수원 여성 납치 살해범) 오원춘의 폭력 행사는 청소년기 또래 집단에 의한 폭력과 우리 사회의 이주노동자 차별이 영향을 미쳤다. 학교, 노동 현장 등에서 차별을 없애는 일이 필요한 이유다. 그리고 오원춘의 폭력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향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남성들이 왜 그렇게 되는가를 살피는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 남성의 폭력 행사가 촉진되는 일련의 과정과 젠더의 작동 방식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한겨레21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흉악범죄’로 일컫는 폭력을 보도할 때 그 범죄를 가해자 개인의 일탈과 병리로 치부하거나 공분을 증폭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남성성 실천이 학교와 군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무엇을 통해 가능했는지, 그리고 그 실천에 영향을 미친 지식 생산과 정치 등 또 다른 남성성들과의 관계까지 함께 조명해주면 좋겠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성폭력과 함께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살인·강도·방화 같은 폭력의 발생 원인으로 범인의 정신건강 문제, 실업·빈곤 같은 불평등 문제, 고립, 가정불화, 모방범죄 심리 등이 주로 꼽힌다. 여기서 우리가 빠뜨리는 이유가 있다. 범인의 대다수가 남성이라는 점이다. 살인·강도·방화 범죄의 약 82%(이하 2023년 기준 경찰청 통계)는 남성이 저지른다.(성폭력 범죄에서 남성이 범인인 비율은 약 96%에 이른다.) 폭력은 이처럼 젠더 불균형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영역 중 하나다.
젠더폭력은 불평등한 젠더 관계로 인해 또는 그 관계를 만들어내는 모든 폭력을 통칭하는 말로, 주된 피해자는 여성이지만 남성과 성소수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행사한 폭력에서만 젠더(성에 따라 의미를 다르게 부여하는 사회문화 구조)를 떠올리고, 그 밖의 상황에서는 젠더의 작동 방식조차 고려하지 않는다. 최윤종이 2023년 8월 서울 관악산 등산로에서 지나가던 여성에게 강간을 시도하고 살해한 사건과 달리, 조선이 2023년 7월 서울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남성 한 명을 살해하고 세 명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과 최원종이 2023년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한 쇼핑몰에 차를 몰고 돌진한 뒤 쇼핑몰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사건에서는 젠더에 관한 논의가 촉발되지 않았다.
하지만 범죄 수행이 젠더 수행, 즉 젠더를 생산하는 반복된 실천 중 하나라는 관점에서 보면 세 사건 모두 젠더가 작동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책 ‘폭주하는 남성성’에서 이들 세 사건 이야기를 시작으로 젠더와 폭력의 관계를 밝힌 추지현 서울대 교수(사회학)를 2025년 7월28일 인터뷰했다. 남성성이란 남성다움의 의미를 획득하는 구체적 실천을 일컫는 말이다.
―책에서 남성성의 실천이 폭력의 맥락을 구성하는 현실에 주목한 이유는.
“‘묻지마 범죄’ ‘흉기 난동 범죄’로 일컫는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들이 왜 그런 폭력을 행사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취약성에 집중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젠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가해자가 이성애 관계에서의 연애·결혼·취업 등 기존 남성다움에 대한 정상성 트랙에서 ‘실패한 남성’으로 인식하는 자신의 주변적 지위(주변화된 남성성)에 대한 분노를 그 원인인 사회의 부정의에 맞서는 에너지가 아니라, 왜 여성·성소수자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자원으로 활용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는 식이다. 즉, 가해자의 남성성 실천이 어떻게 등장했는지를 알아야 폭력으로 귀결되는 남성성의 등장을 막을 수 있다.(추지현 교수는 책에서 남성들의 폭력 사이에 무엇이 놓여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서로의 맥락을 형성하는지를 설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주목했다.
“앞의 세 사건 사이에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폭력의 맥락을 만들어내는 또 다른 남성들의 실천 역시 존재했다. 조선과 최원종은 디시인사이드의 여러 갤러리를 통해 남성으로서의 열패감을 드러내고 인정받았다. 최윤종은 ‘동거녀 살인’이나 무장 탈영 군인의 총기 난사 사건 등 또 다른 남성들이 폭력을 실천한 사례를 검색하며 범행을 감행했다. 그리고 이들의 범죄 이후 그곳에서 다수의 ‘살인 예고 글’이 등장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 예고나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 행사를 독려해온 온라인 커뮤니티는 더 이상 단순한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라 남성으로서의 폭력 행사를 부추기고 정당화하는 체계적인 공간, 즉 젠더불평등을 구조적으로 재생산하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폭력의 젠더화된 맥락을 살피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 가해자의 폭력성에 여성혐오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했고 그 폭력을 가능하게 한 조건은 무엇인지, 즉 문제 해결을 위해 개입할 지점이 어디인지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예컨대 주변화된 남성성으로서 (2012년 수원 여성 납치 살해범) 오원춘의 폭력 행사는 청소년기 또래 집단에 의한 폭력과 우리 사회의 이주노동자 차별이 영향을 미쳤다. 학교, 노동 현장 등에서 차별을 없애는 일이 필요한 이유다. 그리고 오원춘의 폭력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향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남성들이 왜 그렇게 되는가를 살피는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 남성의 폭력 행사가 촉진되는 일련의 과정과 젠더의 작동 방식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한겨레21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흉악범죄’로 일컫는 폭력을 보도할 때 그 범죄를 가해자 개인의 일탈과 병리로 치부하거나 공분을 증폭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남성성 실천이 학교와 군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무엇을 통해 가능했는지, 그리고 그 실천에 영향을 미친 지식 생산과 정치 등 또 다른 남성성들과의 관계까지 함께 조명해주면 좋겠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