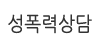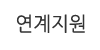친족성폭력 생존자들의 이야기 "아버지가 죽어도 기억은 지워지지 않아요"
‘친족성폭력’이라는 아무도 알고 싶어하지 않는 이야기를 세상 밖으로 꺼낸 사람들이 있다. 폭력으로부터 생존한 이들이다. 같은 아픔을 가진 이들에게는 ‘희망’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인식’을 주고 싶었다. 친족성폭력 생존자의 절반이 넘는 55.2%가 피해가 발생하고 10년이 지나서야 피해 사실을 털어놓을 수 있게 된다는 통계도 있다. 1차 안전망인 가족 내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주변의 지지와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이 스스로를 보듬고 폭력으로부터 해방되기까지 훨씬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여기 오랜 침묵을 깬 생존자들이 있다.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11월 25일)을 앞둔 지난 13일 친족성폭력 피해의 기록을 책으로 남긴 4인(왼쪽부터 명아, 푸른나비, 김영서, 민지)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2012년 ‘은수연’이라는 작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친족성폭력 피해 수기를 펴냈다.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는 제목의 책에는 9년간의 피해 기록이 담겨 있다. 그로부터 8년뒤인 2020년.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을 계기로 그는 본명을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김.영.서. “제 책이지만 필명이어서 소개하지 못했어요. ‘미투’ 정국에 들어서면서부터 내 책이라고 말하고 다녔죠. ‘나만의 미투’를 이어갔어요.” 작가이면서 상담가인 김영서씨는 강의장에서 어느 때보다 독자의 응원을 자주 받는다. 그는 “성폭력 피해를 밝히는 것이 더 이상은 피해자의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서씨처럼 폭력의 이야기를 꺼내놓은 또다른 책이 있다. 푸른나비, 명아, 민지를 포함한 친족성폭력 피해자 12명이 써낸 생존의 기록이 담긴 책 <아무도 알고 싶어하지 않는 이야기>다. 책은 푸른나비의 제안으로 만들어졌다. 집필하는 과정은 모두에게 혹독했다. 과거를 곱씹으며 분노를 눌러 담았다. 명아가 글을 쓴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다. “생존자만의 힘으로 기획부터 제작까지 이뤄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펀딩에 후원하도록 이끈 힘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나 말고 다른 생존자가 있을까.’ 푸른나비와 민지의 첫 만남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졌다. ‘생존자 네트워크 이후’는 성폭력 생존자가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다. 밤에 힘들 때면 댓글 하나 붙잡고 잘 살아 보자며 서로를 다독였다. 마음을 나누다 문득 서로가 궁금해졌다. 셋 모두가 얼굴을 처음 마주한건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친족성폭력 피해자 자조모임 ‘작은 말하기’에서였다.
폭력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됐다. 2019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 통계에 따르면, 전체 성폭력 중 친족 성폭력 상담은 9.5%이며, 그 중에서 7세~13세에 입은 피해가 33.3%로 가장 높다. 7살 때 사촌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한 민지는 “당시 그 일이 범죄인지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성추행을 당해봤다며 친구들과 웃으며 떠들기도 했어요. 사건 이후로 성기에 가려움을 느꼈고, 스스로 때리고 꼬집으며 불쾌한 감각을 잊으려고 애썼어요.”
푸른나비는 늘 집에 있으면 맞는 아이가 됐다. 아빠뿐만 아니라 엄마도 폭력을 일삼았다. 여동생은 언니가 마음이 여리니 반항하지 못해서 당한 거라고 말하기도 했다. 8살부터 10년간 겪은 고통은 결국 해리 장애로 이어졌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4년의 기억은 없다. 생존자들과 이야기하면서 기억이 삭제된 것도 뒤늦게 알았다. “친족성폭력 생존자 6명의 의견을 모아서 국민 청원을 올린 적이 있어요. 청원에 동의해주신 4512명이 저한테는 어른이었어요. 주변엔 없었어요.”
폭력의 기억을 털어놓는 것 자체가 힘들었던, 아니 그게 폭력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이들은 성폭력상담소를 찾고 난 뒤에야 유일한 ‘내 편’을 얻었다. 명아는 내 편이 생기니 우리 같은 사람이 살아있다고 알리고 싶었다. “지금 생존자로 얼굴 마주 하는 분들 있는 반면에 다른 어딘가에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영서 작가님의 책이 큰 힘이 됐어요. 이분이 이렇게 살아 있다. 누군지 몰랐지만 쉼터니까 가끔 소식도 들었어요. 그 힘으로 자기 전에 ‘한강에 뛰어내리는 건 내일 하고, 오늘은 자자.’ 생각했어요. 누군지도 모르는 생존자들을 내 우상으로 삼고 나도 저렇게 살 거야 하고 살아냈거든요.”
이렇게 피해 당사자가 피해를 인식하고, 가해자 처벌을 결심했을 때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있을 수 있다. 친족성폭력의 공소시효 폐지를 위해서 이들은 <공폐단단>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하철을 다 같이 타고 일렬로 선 채로 갑자기 딱 플랜카드를 드는 거죠. 일부러 가족들이 많이 가는 장소로 찾아가요. 가해자가 죽어도 피해는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공소시효부터 폐지하고, 그 다음부터 가해자 처벌도 해야 치유가 시작되지 않을까요?”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자가 의료 지원을 받으려면 여가부 지침상 2년 이상 경과된 피해의 경우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를 요구하고, 성폭력 후유증이라는 소견서를 써주는 것도 한계적”이라며 “시간이 지난 뒤 심리상담으로 치유하려 할 경우 오랜 과정이 필요하지만 의료지원을 받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친족성폭력’이라는 아무도 알고 싶어하지 않는 이야기를 세상 밖으로 꺼낸 사람들이 있다. 폭력으로부터 생존한 이들이다. 같은 아픔을 가진 이들에게는 ‘희망’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인식’을 주고 싶었다. 친족성폭력 생존자의 절반이 넘는 55.2%가 피해가 발생하고 10년이 지나서야 피해 사실을 털어놓을 수 있게 된다는 통계도 있다. 1차 안전망인 가족 내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주변의 지지와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이 스스로를 보듬고 폭력으로부터 해방되기까지 훨씬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여기 오랜 침묵을 깬 생존자들이 있다.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11월 25일)을 앞둔 지난 13일 친족성폭력 피해의 기록을 책으로 남긴 4인(왼쪽부터 명아, 푸른나비, 김영서, 민지)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2012년 ‘은수연’이라는 작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친족성폭력 피해 수기를 펴냈다.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는 제목의 책에는 9년간의 피해 기록이 담겨 있다. 그로부터 8년뒤인 2020년.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을 계기로 그는 본명을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김.영.서. “제 책이지만 필명이어서 소개하지 못했어요. ‘미투’ 정국에 들어서면서부터 내 책이라고 말하고 다녔죠. ‘나만의 미투’를 이어갔어요.” 작가이면서 상담가인 김영서씨는 강의장에서 어느 때보다 독자의 응원을 자주 받는다. 그는 “성폭력 피해를 밝히는 것이 더 이상은 피해자의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서씨처럼 폭력의 이야기를 꺼내놓은 또다른 책이 있다. 푸른나비, 명아, 민지를 포함한 친족성폭력 피해자 12명이 써낸 생존의 기록이 담긴 책 <아무도 알고 싶어하지 않는 이야기>다. 책은 푸른나비의 제안으로 만들어졌다. 집필하는 과정은 모두에게 혹독했다. 과거를 곱씹으며 분노를 눌러 담았다. 명아가 글을 쓴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다. “생존자만의 힘으로 기획부터 제작까지 이뤄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펀딩에 후원하도록 이끈 힘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나 말고 다른 생존자가 있을까.’ 푸른나비와 민지의 첫 만남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졌다. ‘생존자 네트워크 이후’는 성폭력 생존자가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다. 밤에 힘들 때면 댓글 하나 붙잡고 잘 살아 보자며 서로를 다독였다. 마음을 나누다 문득 서로가 궁금해졌다. 셋 모두가 얼굴을 처음 마주한건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친족성폭력 피해자 자조모임 ‘작은 말하기’에서였다.
폭력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됐다. 2019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 통계에 따르면, 전체 성폭력 중 친족 성폭력 상담은 9.5%이며, 그 중에서 7세~13세에 입은 피해가 33.3%로 가장 높다. 7살 때 사촌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한 민지는 “당시 그 일이 범죄인지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성추행을 당해봤다며 친구들과 웃으며 떠들기도 했어요. 사건 이후로 성기에 가려움을 느꼈고, 스스로 때리고 꼬집으며 불쾌한 감각을 잊으려고 애썼어요.”
푸른나비는 늘 집에 있으면 맞는 아이가 됐다. 아빠뿐만 아니라 엄마도 폭력을 일삼았다. 여동생은 언니가 마음이 여리니 반항하지 못해서 당한 거라고 말하기도 했다. 8살부터 10년간 겪은 고통은 결국 해리 장애로 이어졌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4년의 기억은 없다. 생존자들과 이야기하면서 기억이 삭제된 것도 뒤늦게 알았다. “친족성폭력 생존자 6명의 의견을 모아서 국민 청원을 올린 적이 있어요. 청원에 동의해주신 4512명이 저한테는 어른이었어요. 주변엔 없었어요.”
폭력의 기억을 털어놓는 것 자체가 힘들었던, 아니 그게 폭력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이들은 성폭력상담소를 찾고 난 뒤에야 유일한 ‘내 편’을 얻었다. 명아는 내 편이 생기니 우리 같은 사람이 살아있다고 알리고 싶었다. “지금 생존자로 얼굴 마주 하는 분들 있는 반면에 다른 어딘가에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영서 작가님의 책이 큰 힘이 됐어요. 이분이 이렇게 살아 있다. 누군지 몰랐지만 쉼터니까 가끔 소식도 들었어요. 그 힘으로 자기 전에 ‘한강에 뛰어내리는 건 내일 하고, 오늘은 자자.’ 생각했어요. 누군지도 모르는 생존자들을 내 우상으로 삼고 나도 저렇게 살 거야 하고 살아냈거든요.”
이렇게 피해 당사자가 피해를 인식하고, 가해자 처벌을 결심했을 때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있을 수 있다. 친족성폭력의 공소시효 폐지를 위해서 이들은 <공폐단단>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하철을 다 같이 타고 일렬로 선 채로 갑자기 딱 플랜카드를 드는 거죠. 일부러 가족들이 많이 가는 장소로 찾아가요. 가해자가 죽어도 피해는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공소시효부터 폐지하고, 그 다음부터 가해자 처벌도 해야 치유가 시작되지 않을까요?”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자가 의료 지원을 받으려면 여가부 지침상 2년 이상 경과된 피해의 경우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를 요구하고, 성폭력 후유증이라는 소견서를 써주는 것도 한계적”이라며 “시간이 지난 뒤 심리상담으로 치유하려 할 경우 오랜 과정이 필요하지만 의료지원을 받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어디선가 울고 있을 피해자들에게 생존자들은 어떤 말을 전하고 싶을까. 민지는 말했다.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었어. 네가 그런 일이 있었구나. 힘들었겠다.” 피해 경험을 이야기할 때 같이 있어 주는 것,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고 했다. 영서씨는 “부끄러워 해야 할 건 하나도 없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했다. “가족이 가해자일 때는 더 이상 그 순간은 가족이길 멈춰야 하는 잔인함도 필요해요. 폭력을 중단할 수 있는 작은 용기를 내줬으면 좋겠어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