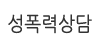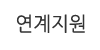한국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이 5년 전에 비해 개선됐으나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
한국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이 5년 전에 비해 개선됐으나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사회가 전반적으로 남녀에게 불평등한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5년 전에 비해 '남녀평등하다'는 대답이 13.7%p 증가했지만 여전히 34.7%에 불과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전국 4490가구(8358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양성 평등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양성평등 의식 수준 및 정책 수요를 수집해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등 중장기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 완화, 직장 내 성차별 관행 감소, 일·생활 균형 제도 이용 확산,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양성평등 인식·수준이 대폭 개선됐다.
2016년에 비해 남녀 모두 '남성은 생계부양, 여성은 자녀양육'이라는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이 크게 완화됐다. 여성에 비해 남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남성 생계부양책임, 직업의 성별분리 인식이 강했다.
가족 내 역할분담에 있어서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한다'에 동의하는 비율은 2016년 42.1%에서 2021년 29.9%로 12.2%p 감소했고,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주된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는 인식도 53.8%에서 17.4%로 36.4%p 하락했다.
남녀의 지위 변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약화됐다. 같은 기간 '아내의 소득이 남편소득보다 많으면 기가 죽는다'와 '남성이 여성 밑에서 일하는 것이 불편하다'에 동의하는 비율은 각각 45.1%에서 30.8%로, 30.4%에서 23.5%로 변화했다.
양성평등수준을 체감을 묻는 질문에서는 사회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높았으나 그룹별 격차가 컸다.
여성의 65.4%, 남성의 41.4%는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답했다. 반면 여성의 6.7%, 남성의 17.0%는 '남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응답했다.
5년 전에 비해 '남녀평등하다'는 대답은 13.7%p 증가(21.0%→34.7%),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9.2%p 감소(62.6%→53.4%), '남성에게 불평등하다'는 4.6%p(16.4%→11.8%) 감소했다.
성별, 연령대별로는 사회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20~30대 여성은 70% 이상이었으나, 남성의 경우 청소년(15-18세)의 31.5%, 20대의 29.2%만이 이에 동의해 큰 격차를 보였다.
영역별로는 여성에게 가장 불평등하다고 인식되는 영역은 '돌봄 책임 분담'(-1.26점)인 반면, '건강 수준'(-0.09점), '교육 수준'(-0.21점) 영역은 남녀평등에 가장 가깝다고 인식했다.
'여성=자녀돌봄'이라는 인식이 완화됐음에도 돌봄 부담 불균형은 여전했다. 의사 결정은 '아내와 남편이 반반한다'는 응답(67.2%)이, 생활비는 '전적으로 또는 주로 남편이 부담한다'는 응답(58.1%)이, 가사·돌봄은 '전적으로 또는 주로 아내가 부담한다'는 응답(68.9%)이 가장 많았다.
맞벌이인 경우에도 60% 이상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아내가 가사와 돌봄을 한다'고 응답(여성 65.5%, 남성 59.1%)해 여전히 가사·돌봄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숙제 또는 공부지도', '등하교 동행' 등 돌봄 관련 모든 활동에서 여성은 '자주 또는 매우 자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남성은 모든 항목에서 '때때로 한다'가 가장 높았다.
2016년과 비교했을 때, 남녀 모두 돌봄 활동이 증가했으나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많이 증가한 셈이다.
남성은 일하는 시간과 여가 시간이 줄고 자기계발과 돌봄을 위한 시간이 늘어난 반면, 여성은 일과 가사에 사용하는 시간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여가 시간이 줄고 돌봄 시간이 늘어났다.
맞벌이 가정의 돌봄시간은 남성 0.7시간, 여성 1.4시간으로 여성이 2배 길었다. 특히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경우 남성 1.2시간 여성 3.7시간으로 3배 이상 차이났다. 코로나19 이후 남녀 모두 가사·돌봄 활동이 증가했으나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많이 증가했다.
최문선 여가부 여성정책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성평등에 대한 개별적인 인식 수준은 많이 높아졌지만 아직 실천으로까지 연결되지 못한 것 같다"며 "개인들의 인식이 변화됐다고 하더라도 조직 차원에서는 문화나 관행이 인식을 따라갈 만큼 바뀌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채용, 업무 배치, 승진 등에서 일어나는 성차별 관행이 소폭 완화됐으며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이 성차별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회사는 직원을 채용할 때 남성을 더 선호한다', '우리 회사는 남성이 하는 업무와 여성이 하는 업무가 따로 있다', '우리 회사에서 여성이 특정 직급이나 직위 이상으로 승진하는 데 암묵적인 제한이 있다'에 각각 33.9%, 39.0%, 24.5%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직원 채용 시 남성 선호 및 성별직무분리 관행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은 각각 45.6%, 46.1%인 반면, 여성은 각각 18.5%, 29.7%였다.
2016년과 비교했을 때 대체로 성차별 관행이 있다는 응답이 감소한 가운데, 채용 단계에서의 성차별에 대한 여성의 인식은 증가했다.
임신·출산·육아휴직 불이익 및 휴가사용·정시퇴근 어려움의 경우 2016년에 비해 '그렇다'는 응답이 크게 감소했다.
출산전후 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등 일·생활 균형제도의 이용이 2016년에 비해 남녀 모두 가능해진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전후 휴가제도는 '남녀 모두 쉽게 이용 가능하다'는 응답이 5년 전에 비해 11%p, 육아휴직제도는 4.9%p 증가했다. 출산전후 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의 이용은 남녀 모두 종사자 성비가 비슷할수록, 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우리 사회 양성평등 의식 수준 향상,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폭력에 대한 민감도 증가는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긍정적 신호"라며 "다만 여성의 경력단절과 돌봄 부담 해소,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폭력 문제 개선 가속화 등 성평등 사회 실현을 촉진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꾸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한국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이 5년 전에 비해 개선됐으나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사회가 전반적으로 남녀에게 불평등한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5년 전에 비해 '남녀평등하다'는 대답이 13.7%p 증가했지만 여전히 34.7%에 불과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전국 4490가구(8358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양성 평등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양성평등 의식 수준 및 정책 수요를 수집해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등 중장기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 완화, 직장 내 성차별 관행 감소, 일·생활 균형 제도 이용 확산,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양성평등 인식·수준이 대폭 개선됐다.
2016년에 비해 남녀 모두 '남성은 생계부양, 여성은 자녀양육'이라는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이 크게 완화됐다. 여성에 비해 남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남성 생계부양책임, 직업의 성별분리 인식이 강했다.
가족 내 역할분담에 있어서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한다'에 동의하는 비율은 2016년 42.1%에서 2021년 29.9%로 12.2%p 감소했고,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주된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는 인식도 53.8%에서 17.4%로 36.4%p 하락했다.
남녀의 지위 변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약화됐다. 같은 기간 '아내의 소득이 남편소득보다 많으면 기가 죽는다'와 '남성이 여성 밑에서 일하는 것이 불편하다'에 동의하는 비율은 각각 45.1%에서 30.8%로, 30.4%에서 23.5%로 변화했다.
양성평등수준을 체감을 묻는 질문에서는 사회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높았으나 그룹별 격차가 컸다.
여성의 65.4%, 남성의 41.4%는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답했다. 반면 여성의 6.7%, 남성의 17.0%는 '남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응답했다.
5년 전에 비해 '남녀평등하다'는 대답은 13.7%p 증가(21.0%→34.7%),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9.2%p 감소(62.6%→53.4%), '남성에게 불평등하다'는 4.6%p(16.4%→11.8%) 감소했다.
성별, 연령대별로는 사회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20~30대 여성은 70% 이상이었으나, 남성의 경우 청소년(15-18세)의 31.5%, 20대의 29.2%만이 이에 동의해 큰 격차를 보였다.
영역별로는 여성에게 가장 불평등하다고 인식되는 영역은 '돌봄 책임 분담'(-1.26점)인 반면, '건강 수준'(-0.09점), '교육 수준'(-0.21점) 영역은 남녀평등에 가장 가깝다고 인식했다.
'여성=자녀돌봄'이라는 인식이 완화됐음에도 돌봄 부담 불균형은 여전했다. 의사 결정은 '아내와 남편이 반반한다'는 응답(67.2%)이, 생활비는 '전적으로 또는 주로 남편이 부담한다'는 응답(58.1%)이, 가사·돌봄은 '전적으로 또는 주로 아내가 부담한다'는 응답(68.9%)이 가장 많았다.
맞벌이인 경우에도 60% 이상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아내가 가사와 돌봄을 한다'고 응답(여성 65.5%, 남성 59.1%)해 여전히 가사·돌봄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숙제 또는 공부지도', '등하교 동행' 등 돌봄 관련 모든 활동에서 여성은 '자주 또는 매우 자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남성은 모든 항목에서 '때때로 한다'가 가장 높았다.
2016년과 비교했을 때, 남녀 모두 돌봄 활동이 증가했으나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많이 증가한 셈이다.
남성은 일하는 시간과 여가 시간이 줄고 자기계발과 돌봄을 위한 시간이 늘어난 반면, 여성은 일과 가사에 사용하는 시간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여가 시간이 줄고 돌봄 시간이 늘어났다.
맞벌이 가정의 돌봄시간은 남성 0.7시간, 여성 1.4시간으로 여성이 2배 길었다. 특히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경우 남성 1.2시간 여성 3.7시간으로 3배 이상 차이났다. 코로나19 이후 남녀 모두 가사·돌봄 활동이 증가했으나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많이 증가했다.
최문선 여가부 여성정책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성평등에 대한 개별적인 인식 수준은 많이 높아졌지만 아직 실천으로까지 연결되지 못한 것 같다"며 "개인들의 인식이 변화됐다고 하더라도 조직 차원에서는 문화나 관행이 인식을 따라갈 만큼 바뀌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채용, 업무 배치, 승진 등에서 일어나는 성차별 관행이 소폭 완화됐으며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이 성차별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회사는 직원을 채용할 때 남성을 더 선호한다', '우리 회사는 남성이 하는 업무와 여성이 하는 업무가 따로 있다', '우리 회사에서 여성이 특정 직급이나 직위 이상으로 승진하는 데 암묵적인 제한이 있다'에 각각 33.9%, 39.0%, 24.5%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직원 채용 시 남성 선호 및 성별직무분리 관행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은 각각 45.6%, 46.1%인 반면, 여성은 각각 18.5%, 29.7%였다.
2016년과 비교했을 때 대체로 성차별 관행이 있다는 응답이 감소한 가운데, 채용 단계에서의 성차별에 대한 여성의 인식은 증가했다.
임신·출산·육아휴직 불이익 및 휴가사용·정시퇴근 어려움의 경우 2016년에 비해 '그렇다'는 응답이 크게 감소했다.
출산전후 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등 일·생활 균형제도의 이용이 2016년에 비해 남녀 모두 가능해진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전후 휴가제도는 '남녀 모두 쉽게 이용 가능하다'는 응답이 5년 전에 비해 11%p, 육아휴직제도는 4.9%p 증가했다. 출산전후 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의 이용은 남녀 모두 종사자 성비가 비슷할수록, 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우리 사회 양성평등 의식 수준 향상,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폭력에 대한 민감도 증가는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긍정적 신호"라며 "다만 여성의 경력단절과 돌봄 부담 해소,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폭력 문제 개선 가속화 등 성평등 사회 실현을 촉진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꾸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