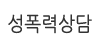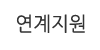성폭력·차별… 변화 이끈 여성들의 외침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다. 1908년 이날, 미국 여성 섬유노동자 1만5000여명이 뉴욕 러트거스광장에서 노동조건 개선과 여성 참정권을 요구하며 벌인 시위가 계기가 됐다. 당시 여성들은 거리를 행진하며 “우리에게 빵(생존권)뿐 아니라 장미(인권·참정권)도 달라”고 외쳤다. 미국 전역에서 여성에게 참정권이 부여된 건 1920년이다.
신간 ‘19세기 허스토리’는 제국주의, 산업화, 혁명을 겪으며 요동친 서구 19세기 여성 운동사다. 서양사 연구자 여섯 명이 19세기가 서구 여성에게 어떤 시대였는지, 19세기 여성의 역사적 경험은 무엇인지를 당대 시대의 초상이라 할 인물과 집단을 통해 드러낸다.
주인공은 아이티혁명기에 싸우고 연대하며 자유를 혁신해간 유색인 여성들, 미국 첫 세대 공장노동자인 로웰 여공들, 생시몽주의의 이상과 노동자 공동생산조합에 헌신한 프랑스의 사회주의자 폴린 롤랑, 파리코뮌을 이끈 혁명가 루이즈 미셸, 미국에서 여성참정권을 처음 주장한 엘리자베스 캐디 스탠턴, 독일 여성운동의 선구자로 교육과 고용 평등을 내세운 루이제 오토, 빅토리아 시대의 젠더 규범을 수용하는 동시에 전복한 영국 작가 세라 콜리지다.
이 중 1820∼40년대에 임금노동 세계로 진출한 로웰 여공 1세대는 중산층 지식인 여성들보다 앞서 집단적이고 공식적으로 자기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노동자 문집인 ‘로웰 오퍼링’을 펴내 자신들의 경험과 사유를 정제된 언어로 표현했다. 1830년대에는 임금 삭감에 맞서 파업을 전개했고, 1840년대에는 세계 최초로 ‘10시간 노동제’ 운동을 조직했다. 독립과 자유는 적절한 임금과 노동조건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깨달음이 이들을 행동하게 했다.
로웰 여공들은 경제활동 인구이자 시민으로서 여성의 권리를 주장했지만, 기득권층의 반발에 부딪혀 대다수가 임노동 시장을 떠나 가정으로 돌아간다. 이들이 발전시킨 자매애와 여성의식은 집단 차원으로 진화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들이 10-20대에 여공으로 일하며 이룬 지적·문화적·사회적 개혁은 여성운동과 노동운동의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로웰 여공 1세대의 성취와 한계는 이후 여성 임금노동자의 역사에서 비슷하게 반복되었다. 시민의 지위에 걸맞은 임금을 달라는 이들의 주장은 지금도 실현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더 타임스’와 ‘에스콰이어’가 ‘올해의 책(2020)’으로 선정한 ‘관통당한 몸’은 30여년 동안 분쟁지역 전문기자로 활동한 저자가 전쟁 성폭력의 실태를 고발한 책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위안부부터 독일 여성에 대한 소련 군대의 성폭행, 미얀마의 로힝야 집단 학살, 1994년 르완다 집단 강간, 보스니아의 강간 수용소, 보코하람의 나이지리아 여학생 납치, 야디지족 여성에 대한 ISIS의 만행까지, 저자는 시대와 지역을 넘나들며 극단적인 고통의 증언을 전한다.
본문은 그리스 레로스 섬에서 만난 피난 소녀가 보여준 영상 이야기에서 시작한다. 열두세 명의 여성이 철창에 갇혀 있었고 AK소총을 어깨에 멘 아랍 남성이 몰려들어 야유하고 있었다. 남자들이 뒤로 물러난 순간 불꽃이 철장을 집어삼켰다. 저자에게 소녀는 “우리 언니예요. 처녀들을 산 채로 불태우는 거예요”라고 설명한다.
이어지는 내용은 아직 말도 하지 못하는 영아 피해자부터 “염소처럼 팔려다닌” 소녀, 가족 앞에서 성폭력을 당한 여인, 젖가슴이 잘려나가고 성기가 훼손된 피해자까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비극의 한계치를 넘어선다.
이 책에서 저자는 세계의 여러 전장에서 벌어지는 전쟁 성폭력의 실체를 고발하고, 그것이 왜 그리고 어떻게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무기로 활용되는지를 밝혀낸다. 전시 성폭력은 그 규모와 빈도에도 세계에서 가장 무시되는 전쟁 범죄다. 이 책은 이처럼 끔찍한 범죄에 대한 고발이지만, 동시에 생존과 극복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상처 입은 여성 그리고 살아남아 일어서고 발언하며 정의를 위해 싸우는 여성들을 만날 수 있다.
책 ‘우리의 분노는 길을 만든다’는 전 생애에 걸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이 마주하는 부당한 현실을 분석하고, 그로 인한 분노를 ‘변화를 위한 촉매제’로 이용할 권리를 주장하는 논픽션이다. 저자 소라야 시멀리는 미국의 소셜미디어 및 언론과 관련된 페미니즘 이슈의 최전선에 있는 활동가. 저자는 방대한 연구자료와 인터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년기에서 성년기에 이르기까지 가정, 학교, 일터에서 여성이 분노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삶의 조건과 그 분노를 부인하고 감추도록 압력을 받는 모순적인 현실을 망라한다.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가라는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체득하면 모욕을 가늠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기대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기대가 없다는 것은 침범할 것도 없다는 말이며, 침범이 없다는 것은 화를 내는 반응도 없다는 말이다. 이 순환은 돌고 돈다.”
저자는 분노에 깃든 변화의 힘에 주목하며, 분노는 우리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길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감정을 온전히 우리 것으로 소유하고 그 이면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여성에게 분노가 마지막까지 허용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것이 불의에 대항하는 제1방어선이기 때문이다. 여성은 분노 대신 슬픔을 느끼기를 강요받지만 슬픔이 ‘후퇴’의 감정이라면 분노는 ‘접근’의 감정이다. 슬픔과 달리 분노는 주도적으로 변화를 만들고 도전을 마주하는 수단이고, 변화를 부르고 우리를 세상에 발붙이게 하는 희망과 진취의 감정이다. 저자는 분노를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분노의 기술’ 열 가지를 제안한다.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다. 1908년 이날, 미국 여성 섬유노동자 1만5000여명이 뉴욕 러트거스광장에서 노동조건 개선과 여성 참정권을 요구하며 벌인 시위가 계기가 됐다. 당시 여성들은 거리를 행진하며 “우리에게 빵(생존권)뿐 아니라 장미(인권·참정권)도 달라”고 외쳤다. 미국 전역에서 여성에게 참정권이 부여된 건 1920년이다.
신간 ‘19세기 허스토리’는 제국주의, 산업화, 혁명을 겪으며 요동친 서구 19세기 여성 운동사다. 서양사 연구자 여섯 명이 19세기가 서구 여성에게 어떤 시대였는지, 19세기 여성의 역사적 경험은 무엇인지를 당대 시대의 초상이라 할 인물과 집단을 통해 드러낸다.
주인공은 아이티혁명기에 싸우고 연대하며 자유를 혁신해간 유색인 여성들, 미국 첫 세대 공장노동자인 로웰 여공들, 생시몽주의의 이상과 노동자 공동생산조합에 헌신한 프랑스의 사회주의자 폴린 롤랑, 파리코뮌을 이끈 혁명가 루이즈 미셸, 미국에서 여성참정권을 처음 주장한 엘리자베스 캐디 스탠턴, 독일 여성운동의 선구자로 교육과 고용 평등을 내세운 루이제 오토, 빅토리아 시대의 젠더 규범을 수용하는 동시에 전복한 영국 작가 세라 콜리지다.
이 중 1820∼40년대에 임금노동 세계로 진출한 로웰 여공 1세대는 중산층 지식인 여성들보다 앞서 집단적이고 공식적으로 자기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노동자 문집인 ‘로웰 오퍼링’을 펴내 자신들의 경험과 사유를 정제된 언어로 표현했다. 1830년대에는 임금 삭감에 맞서 파업을 전개했고, 1840년대에는 세계 최초로 ‘10시간 노동제’ 운동을 조직했다. 독립과 자유는 적절한 임금과 노동조건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깨달음이 이들을 행동하게 했다.
로웰 여공들은 경제활동 인구이자 시민으로서 여성의 권리를 주장했지만, 기득권층의 반발에 부딪혀 대다수가 임노동 시장을 떠나 가정으로 돌아간다. 이들이 발전시킨 자매애와 여성의식은 집단 차원으로 진화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들이 10-20대에 여공으로 일하며 이룬 지적·문화적·사회적 개혁은 여성운동과 노동운동의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로웰 여공 1세대의 성취와 한계는 이후 여성 임금노동자의 역사에서 비슷하게 반복되었다. 시민의 지위에 걸맞은 임금을 달라는 이들의 주장은 지금도 실현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더 타임스’와 ‘에스콰이어’가 ‘올해의 책(2020)’으로 선정한 ‘관통당한 몸’은 30여년 동안 분쟁지역 전문기자로 활동한 저자가 전쟁 성폭력의 실태를 고발한 책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위안부부터 독일 여성에 대한 소련 군대의 성폭행, 미얀마의 로힝야 집단 학살, 1994년 르완다 집단 강간, 보스니아의 강간 수용소, 보코하람의 나이지리아 여학생 납치, 야디지족 여성에 대한 ISIS의 만행까지, 저자는 시대와 지역을 넘나들며 극단적인 고통의 증언을 전한다.
본문은 그리스 레로스 섬에서 만난 피난 소녀가 보여준 영상 이야기에서 시작한다. 열두세 명의 여성이 철창에 갇혀 있었고 AK소총을 어깨에 멘 아랍 남성이 몰려들어 야유하고 있었다. 남자들이 뒤로 물러난 순간 불꽃이 철장을 집어삼켰다. 저자에게 소녀는 “우리 언니예요. 처녀들을 산 채로 불태우는 거예요”라고 설명한다.
이어지는 내용은 아직 말도 하지 못하는 영아 피해자부터 “염소처럼 팔려다닌” 소녀, 가족 앞에서 성폭력을 당한 여인, 젖가슴이 잘려나가고 성기가 훼손된 피해자까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비극의 한계치를 넘어선다.
이 책에서 저자는 세계의 여러 전장에서 벌어지는 전쟁 성폭력의 실체를 고발하고, 그것이 왜 그리고 어떻게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무기로 활용되는지를 밝혀낸다. 전시 성폭력은 그 규모와 빈도에도 세계에서 가장 무시되는 전쟁 범죄다. 이 책은 이처럼 끔찍한 범죄에 대한 고발이지만, 동시에 생존과 극복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상처 입은 여성 그리고 살아남아 일어서고 발언하며 정의를 위해 싸우는 여성들을 만날 수 있다.
책 ‘우리의 분노는 길을 만든다’는 전 생애에 걸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이 마주하는 부당한 현실을 분석하고, 그로 인한 분노를 ‘변화를 위한 촉매제’로 이용할 권리를 주장하는 논픽션이다. 저자 소라야 시멀리는 미국의 소셜미디어 및 언론과 관련된 페미니즘 이슈의 최전선에 있는 활동가. 저자는 방대한 연구자료와 인터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년기에서 성년기에 이르기까지 가정, 학교, 일터에서 여성이 분노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삶의 조건과 그 분노를 부인하고 감추도록 압력을 받는 모순적인 현실을 망라한다.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가라는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체득하면 모욕을 가늠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기대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기대가 없다는 것은 침범할 것도 없다는 말이며, 침범이 없다는 것은 화를 내는 반응도 없다는 말이다. 이 순환은 돌고 돈다.”
저자는 분노에 깃든 변화의 힘에 주목하며, 분노는 우리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길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감정을 온전히 우리 것으로 소유하고 그 이면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여성에게 분노가 마지막까지 허용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것이 불의에 대항하는 제1방어선이기 때문이다. 여성은 분노 대신 슬픔을 느끼기를 강요받지만 슬픔이 ‘후퇴’의 감정이라면 분노는 ‘접근’의 감정이다. 슬픔과 달리 분노는 주도적으로 변화를 만들고 도전을 마주하는 수단이고, 변화를 부르고 우리를 세상에 발붙이게 하는 희망과 진취의 감정이다. 저자는 분노를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분노의 기술’ 열 가지를 제안한다.